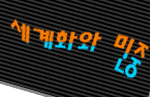| [포커스] FTA 홍수, 어떻게 볼 것인가? |
세계화와 민중 제37호
|
|
이창근(민주노총 국제부장)
|
한국 정부와 자본의 FTA 추진 속도가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 한칠레FTA가 이미 발효되었으며, 2005년 타결을
목표로 한일/한싱가폴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나아가
한ASEAN 협상이 내년부터 공식 개시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미국, EU, 중국, 한중일, 동아시아 등과도 FTA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로드맵도 발표된 상황이다.
이러한 자본과 정부의 FTA 추진 배경에는 소위 말하는
‘대외통상환경의 변화’라는 시기적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FTA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의 확산, 잇따른 WTO
각료회의의 합의 실패에 따른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 상실
등의 국제적 요인이 작용한 것이다. 즉, FTA 대세에 참여하지
않으면 손해와 고립을 초래한다는 인식이 그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제 아래, 정부는 동시다발적으로 FTA 협상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 배경에는
전략적 요인이 존재함을 염두에 둬야 한다. 즉, ‘개방형
통상국가 패러다임 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이라는 전략적 판단아래 FTA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로의 편입과 구조조정의 지속적
추진과 촉진을 위한 정권과 자본의 전략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개방형 통상국가 패러다임은 전통적인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전략을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라는 상황에 조응하여,
극단으로 밀어붙인 전략 구상이라 할 수 있다. 내수지향적 업종,
사회 공공 영역, 농업 및 중소제조업 등을 완전히 포기하고,
초국적자본화된 국내 소수 재벌, 몇몇 경쟁력있는 수출지향적
업종의 이익만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의 구상이다. 즉,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과 이를 통한 신(新)성장동력 구축을
위해, 현재 경쟁력 있는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미래형자동차, 차세대 이동통신,
바이오 장기/신약 등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산업’을 선정하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FTA는
이러한 구조개혁을 위한 환경과 모멘텀 조성을 위한 적극적
전략으로 풀이되며, 이는 한국 경제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을
완성시키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구상이 채택된 것은, 근본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가 강요하는 생존 전략 선택의 딜레마, 여기에
한국경제에 대한 초국적자본의 지배력 증대와 국내재벌의
초국적자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현재 이러한 전략적 구상이 국내 지배블록 내에서
완벽한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정부의 FTA
추진 로드맵이 미국, EU, 일본 등 거대경제권을 지향하고, 그
파장이 자본에게도 만만치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배블록
내에서 전략적 구상의 내용과 추진 방식, 속도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일FTA에 대한 자본의 소극적 저항이 그 예일 것이다.
이러한 정부와 자본의 전략적 선택은 고용과 내수의 증가 없는
수출주도의 양적 성장의 심화, 실업과 불안정 고용의 구조화
등의 파괴적 결과만을 가져올 뿐이다. 나아가 개방형 통상국가
패러다임의 구축은 금융개방형 축적 체제의 완성을 본질로 하며,
이는 한국 경제에 대한 초국적금융자본의 완전한 지배, 이로
인한 국민경제적·사회적 영역의 붕괴를 동반할 것이다. 지금은
빈곤과 고용, 노동자와 사회적 권리의 보장을 동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이 필요할 때이며, 국제적으로나 지역적으로도
다양성을 존중한 속에서, 상호 공존과 협력이 가능한 패러다임의
형성이 필요할 때이다. FTA는 현재 정반대의 길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
|
2004-10-07 16:35:05
|
|